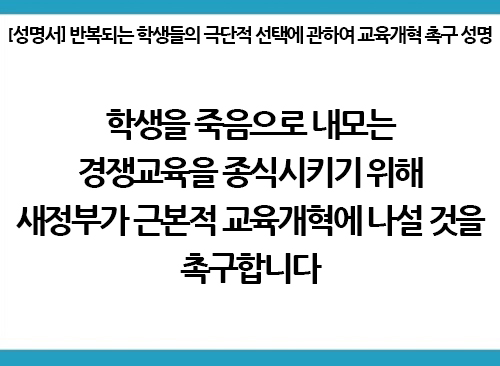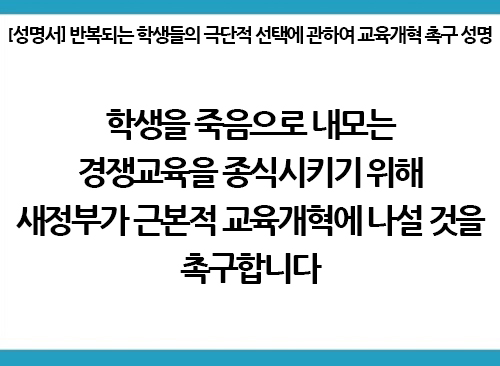최근 부산에서 세 명의 학생에 대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영등포 학생 사건의 경우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혔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 선택의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말해줍니다. 교육 고통이 심각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불안과 절망이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이 끔찍한 현실은 쉼 없이 반복되고 사회의 관심은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사 한두 개로 짧게 다뤄지고 곧 잊히는 이 황폐한 현실 앞에서, 좋은교사운동은 깊은 슬픔과 함께 우리 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육의 기저에 깊이 뿌리내린 철저한 비교와 경쟁 중심의 교육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비교와 선별 속에 자라납니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교육 주체들이 이러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고, 교육 당국도 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는 여전히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고교 입시마저도 경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영등포구의 학원에 걸린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전해 받고 있는 메시지는 이토록 선명합니다.
최근에는 수행평가가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85%가 현행 수행평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수행평가라는 형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된 진단입니다. 원래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역량을 길러가는 ‘과정 중심 평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보다는 옆 친구보다 나은 결과물을 제출해야만 높은 평가를 받는, 철저히 상대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행평가든, 지필평가든, 논술평가이든 형식만 바뀔 뿐 학생들의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체제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지는 ‘성장’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육 고통은 더 이상 대학입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입시까지 경쟁 구조가 확장되어 왔으며, 그 선발 과정이 다시 대학입시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뒤처질까’라는 불안에 일찌감치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줄 세우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0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목고와 자율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목되었습니다.